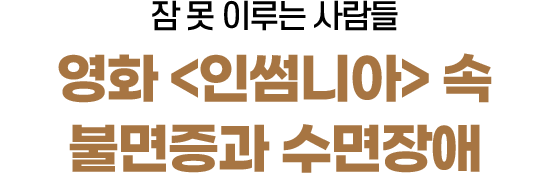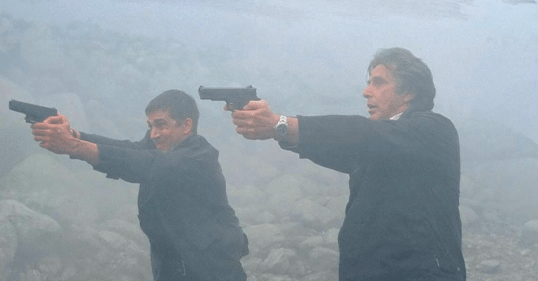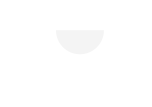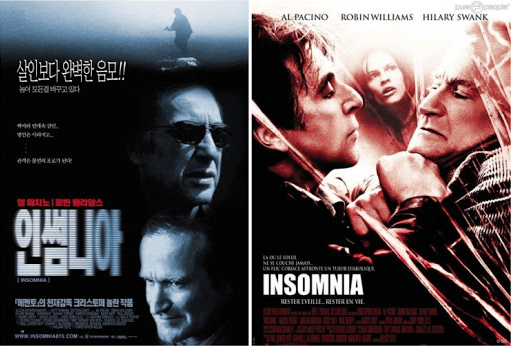2020 NOV + DECVOL. 179
건강 이야기
-
테마 건강
아동기 생활습관이 평생 몸 건강·마음 건강 결정
-
테마 특강
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(ADHD) 바로 알기
-
HIRA 빅데이터
ADHD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
-
테마 레시피
구워도 튀겨도 맛있는 대하
-
평가 정보
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
-
우리 동네 병원
우리 동네 폐렴 진료 잘하는 병원
-
우리집 상비약
흔하게 사용하는 외용제, 성분확인! 유효기간 확인! 사용방법 확인!
심평원 이야기
-
심평 토크쇼
빅데이터실은 무슨 일을 하나요?
-
소통 의료현장
광주광역시 다사랑병원
-
상생현장
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는 리스 & 꽃다발 만들기
-
특별기획
2020년 HIRA 돌아보기
-
미디어 속으로
영화 <인썸니아> 속 불면증과 수면장애
-
마음연구소
건강 염려도 지나치면 병이다
-
HIRA NEWS
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식 개최 외
-
독자 마당
독자 의견
정책 이야기
-
의약계 안내사항 1
2019년(2차)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
-
의약계 안내사항 2
2019년(2주기 1차)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
-
의약계 안내사항 3
요양(의료)급여비용 ‘자율점검제’ 항목 안내
-
의약계 안내사항 4
중계시스템으로 진료의뢰 시 e-Form 시스템의 표준서식 제출에 따른 수가 차등화
가판대 이동 

다른호 보기